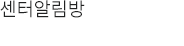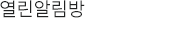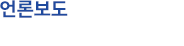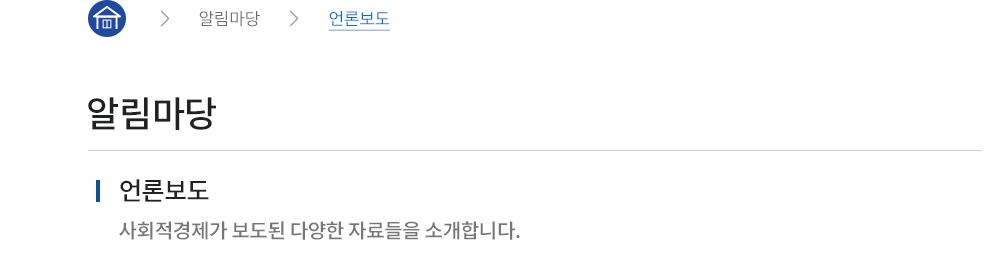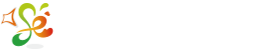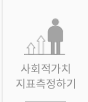넓은 세계가 나를 부른다…신세대들 해외창업 바람
페이지 정보
본문
등록 : 2014.05.20 19:15수정 : 2014.05.20 20:31
 |
쏘울오브아프리카 공동창업자들이 지난해 7월 아프리카 탄자니아의 팅가팅가예술인협동조합을 방문했다. 올해 초에는 협동조합과 재라이선싱 계약을 맺어 2차 파생상품 개발도 가능해졌다. 쏘울오브아프리카 제공 |
[사회적 경제] 해외로 가는 청년 소셜벤처(하)
한 공정여행사의 창업멤버였던 서선미씨는 창업 3년 만인 2012년 2월 회사를 그만뒀다. 아시아의 수많은 관광지와 여행자를 여행사가 연결하는 방식에 한계를 느끼고, 여행자와 지역사회를 직접 연결해주는 새로운 기술 방식이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자신의 새로운 사업모델을 현장에서 확인하기 위해 필리핀, 타이, 인도네시아 등으로 떠났다. 타이에서 만난 소셜벤처 인큐베이팅 단체 ‘체인지퓨전’의 창립자인 수닛 슈레스타 대표는 서씨의 아이디어를 듣고 그 자리에서 투자를 결정했다. 슈레스타 대표의 소개로 타이 소셜벤처 ‘오픈드림’이 창업팀에 합류하면서 누리집 개발을 맡았다.
서선미 대표는 “필리핀의 보홀 같은 세계적인 관광지조차 현지 주민에게 돌아가는 수익은 많지 않아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아 해외로 나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현지 주민과 여행자를 직접 연결하는 방식이 아시아의 사회구조적 문제 해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데에 다른 창업자들도 공감한 것 같다”고 말했다. 공동창업자들은 서울과 방콕을 오가며 누리집 기획과 개발을 진행했고, 지난해 초 크라우드 매핑(Crowd Mapping) 기술을 적용한 플레이플래닛(letsplayplanet.com)을 열었다. 사용자들이 올리는 지역 기반의 정보를 공유하는 크라우드 매핑을 이용해 아시아 곳곳의 공정여행 프로그램들을 지도로 보여준다. 여행자가 여행사를 통하지 않고도 여행을 기획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다국적 네트워크 기반으로 사업 구상
글로벌 소셜벤처가 잇따라 등장하고 있다. 기존 소셜벤처들이 국내에서 내실을 다져 해외까지 사업을 확장해왔다면, 신세대 글로벌 소셜벤처들은 다양한 다국적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창업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지식재산권 관련 연구기관에서 제3세계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이영주씨는 2012년 말 회사를 그만두고 친구가 있던 아프리카로 떠났다. 공정무역에 관심이 많았던 이씨는 아프리카 예술인들의 열악한 현실을 목격하고, 아프리카 회화 작품의 공정무역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커피나 초콜릿 등 식품에 집중된 다른 공정무역 사업과 차별화할 수 있고, 영어가 가능한 나라가 많아 언어 면에서 아시아보다 유리하다는 판단도 있었다. 한국에 돌아온 이씨는 32살 동갑내기 친구인 장녕·김은성씨와 함께 쏘울오브아프리카(blog.naver.com/soulofafrica)를 창업했다. 이들은 몇몇 기업재단의 후원을 받아 지난해 여름 아프리카를 방문해 예술인들과 본격적인 계약을 맺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아프리카 예술인들이 저작권 개념이 없어 자신의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몇몇 유럽 판매상들이 저렴하게 작품을 구입한 뒤, 마치 자신이 그 작품의 창작자인 양 저작권까지 행사하고 있었던 것이다. 올해 초 다시 아프리카를 방문한 쏘울오브아프리카는 케냐·탄자니아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저작권 교육을 먼저 실시했다. 그 뒤에 저작권자가 합당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재라이선싱(sub-licensing) 계약을 맺었다. 특히 탄자니아의 팅가팅가예술인협동조합과 재라이선싱 계약을 맺음으로써 팅가팅가 캐릭터를 활용한 2차 파생상품 개발이 가능해졌다. 팅가팅가는 아프리카 동물을 활용한 표현기법으로 이를 활용한 만화영화가 제작되기도 했다. 쏘울오브아프리카는 최근 한국 기업에 팅가팅가 캐릭터를 활용한 기념품을 납품하기도 했다. 이영주 쏘울오브아프리카 대표는 “처음 창업할 때엔 판매 수익금의 일부를 취약계층 예술인과 지역사회에 환원하겠다는 게 주된 목표였는데, 지금은 아프리카 예술인들의 권리보호를 위해 저작권 지식이전 사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
쏘울오브아프리카가 팅가팅가 캐릭터를 활용해 기업에 납품한 에코백. 쏘울오브아프리카 제공 |
쏘울오브아프리카, 플레이플래닛
자신의 다국적 네트워크 기반 삼아
아시안허브는 해외봉사 경험 계기
결혼이민자 재능 활용 사업 펼쳐
트리플래닛은 엔지오와 손잡고
숲 조성 등 국제개발사업 진행
정부 지원 없고 현장성 약한 게 흠
해외봉사 계기로 결혼이민자기업 창업
해외 봉사활동이 창업의 계기가 된 경우도 있다. 대기업에서 홍보와 사회공헌업무를 담당하던 최진희씨는 2004년 회사를 그만두고 한국국제협력단 소속 해외봉사단원으로 캄보디아에 갔다. 한국인 관광객들이 많은 시엠립의 한 대학에서 2년6개월간 한국어를 가르쳤고, 귀국한 뒤에도 인터넷 카페를 통해 제자들과 교류를 계속했다. 재취업과 결혼 등으로 바쁜 와중에도 와이엠시에이(YMCA) 등 시민단체에서 한국어 교육 등 자원봉사를 하며 캄보디아 결혼이민자들을 만났다. 최씨는 “양쪽 언어를 잘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 부부 상담도 자주 도와드렸는데, 두 나라간 쌍방향 이해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특히 여성의 권익이 높은 동남아 국가에서 성장한 결혼이민자들은 가부장적인 시댁과의 관계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고등교육을 받은 결혼이민자들은 직업이나 사회활동에 대한 욕구가 많지만, 시부모나 남편의 반대로 포기하는 경우도 많았다. 회사 일과 자원봉사를 병행하기 힘들어진 2013년 초 최씨는 결혼이민자들이 자신의 재능을 살려 다문화·언어강사나 통·번역가로 활동하는 소셜벤처 아시안허브(asianhub.kr)를 창업했다. 초등학교의 방과후학교에서 다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하거나 캄보디아 교재의 번역, 강의 통역 등 다양한 일자리를 결혼이민자에게 제공하고 있는 아시안허브는 올해 초에는 캄보디아지사까지 설립했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캄보디아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방문학습지 사업을 준비하기 위해서다.
엔지오와 협업으로 국제개발사업 진행
트리플래닛(treepla.net)은 국제개발 비정부기구(NGO)와의 협업을 통해 해외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용자들이 게임을 통해 나무를 키우는 데 성공하면, 기업의 광고나 후원을 받아 실제 나무를 심는 식이다. 2011년부터 지금까지 아시아·아프리카 등 세계 8개 나라에 50여곳의 숲을 조성했다. 김형수 트리플래닛 대표는 “나무를 많이 심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아프리카에는 한 가구당 두세 그루의 과일나무를 심어 아이들의 학비에 보탤 수 있도록 한다”며 “신뢰성 있는 현지 파트너를 확보하는 게 이 사업의 관건”이라고 말했다. 현지 파트너 대부분이 사업 경험이 많고 신뢰성이 검증된 국제개발 엔지오지만, 인도네시아의 경우는 특별하다. 김 대표는 2011년 초 서울대 박사과정에 있던 인도네시아 유학생을 알게 되었고, 트리플래닛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해 여름 인도네시아로 귀국한 유학생은 어린이들과 함께 나무를 심으며 숲의 가치를 가르쳐주는 다타라재단(Da Tara Foundation)을......
출처: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638064.html
원낙연 한겨레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yanni@hani.co.kr
- 이전글[책과 삶]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해, 다시 사람을 꿈꾸다 14.05.26
- 다음글6개월간 6개大돌며 ‘반짝 창업 아이디어’ 발굴 14.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