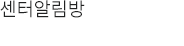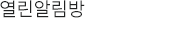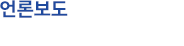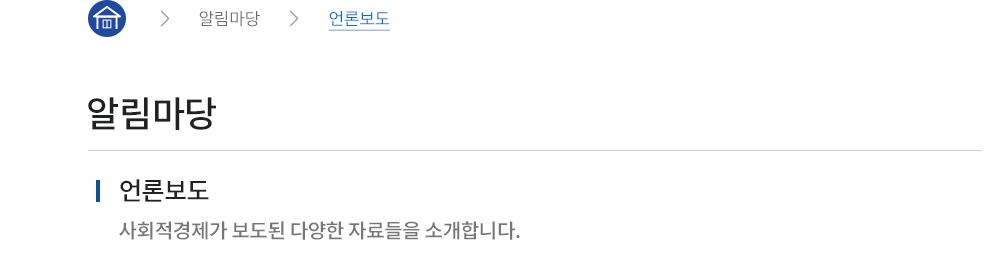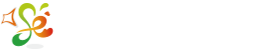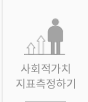벤처캐피탈(VC)등의 투자가 몰리면서 소셜벤처들도 다양해지고 있다. 개인·단체로부터 투자를 받아 ‘트리플래닛’이 조성한 숲. [사진 각 업체]
‘세상 모든 사람이 나무를 심을 때까지.’
VC·금융권 투자 작년에만 530억
공유경제·친환경 아이디어 속출
보조금으로 연명하던 때와 달라
“투자자 모집기관 다양해져야”
‘트리플래닛(Tree Planet)’이란 국내 소셜벤처의 표어다. 2010년 설립된 이 회사는 개인·단체로부터 투자를 받아 숲을 조성하는 사회적 활동을 한다. 서울의 새 명소로 떠오른 개포동 ‘신화숲’과 여의도 ‘소녀시대숲’, 올 4월 전남 진도군 팽목항에 조성된 ‘세월호 기억의 숲’ 모두 이 회사 손을 거쳤다. 지금껏 12개국에 116개 숲을 조성하고 55만여 그루의 나무를 심었다. 실적과 가능성을 인정받아 지난해 한 투자사로부터 8억원을 유치했다.

벤처캐피탈(VC)등의 투자가 몰리면서 소셜벤처들도 다양해지고 있다. 도심 속 양봉 사업을 벌이는 ‘어반비즈서울’. [사진 각 업체]
2013년 생긴 어반비즈서울은 도심 속 양봉이란 사업 아이템으로 연간 1~1.5t의 꿀을 수확한다. 서울 명동 유네스코회관 옥상정원 등 수도권 25곳에 양봉장을 운영한다. 공기업에 다니다가 소셜벤처를 창업한 박진 어반비즈서울 대표는 “유럽·일본에서 도심 속 양봉이 관광 모델로 유명해진 현상에 주목했다”고 말했다.

벤처캐피탈(VC)등의 투자가 몰리면서 소셜벤처들도 다양해지고 있다. 공유경제 모델에 아웃도어 활동을 접목한 ‘프렌트립’. [사진 각 업체]
소셜벤처가 급증하면서 전성기를 맞고 있다. 인재와 투자가 몰린다. 정부 보조금으로 간신히 운영되던 때와는 분위기가 사뭇 달라졌다. 지난해 하나금융투자 등으로부터 19억원을 투자받은 ‘프렌트립’은 패러글라이딩·윈드서핑 등 아웃도어 활동에 공유경제 개념을 접목한 소셜벤처다. 이런 아웃도어 활동을 원하는 소비자끼리, 또는 전문가와 연결해주는 소셜 액티비티 플랫폼 ‘프립’을 만들었다. 3년간 약 10만 명이 서비스를 이용했다.
제조업에 국한됐던 소셜벤처의 사업 영역도 환경·교육·여행·에너지·헬스케어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다. 소셜벤처 끼리의 협업도 활발하다. 위안부 할머니들의 그림을 응용한 디자인 제품을 만드는 ‘마리몬드’는 노숙인을 고용해 친환경 옷걸이를 만들던 ‘두손컴퍼니’에 물류를 맡겼다.
소셜벤처 전성시대는 벤처캐피탈(VC)과 금융권의 일명 ‘임팩트 투자(사회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하는 투자)’ 강화로 열렸다. 국내에선 지난해 530억원의 임팩트 투자가 이뤄졌다. 이덕준 D3쥬빌리 대표, 정경선 HGI 대표, 김재현 크레비스파트너스 대표, 이재웅 다음 창업자 등이 국내 대표적인 임팩트 투자자로 꼽힌다. 이덕준 대표는 5년간 34곳에 약 30억 원을 투자해 4곳에서 투자금을 회수했다. 이재웅 씨는 2008년 벤처 투자·인큐베이팅 기관인 ‘소풍’을 설립했다. 이후 14개 국내외 소셜벤처에 투자해 그중 6곳이 후속 투자를 받았다.
대기업의 중장기적 투자도 한몫을 했다. 2012년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 ‘C랩’을 도입해 스왈라비 등의 소셜벤처 탄생을 이끈 삼성전자, 2010년5월 장애인·노약자용 보조·재활기구 제조를 하는 ‘이지무브’를 만든 현대자동차그룹, 2010년1월 대기업 최초로 ‘사회적기업단’를 만들어 운영해온 SK그룹이 대표적이다. 삼성 관계자는 “회사 지시만 따르던 사내 인재들이 다양한 벤처 아이디어를 고민하면서 더 능동적·적극적으로 일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벤처캐피탈(VC)등의 투자가 몰리면서 소셜벤처들도 다양해지고 있다. 폐기물 없이 의류를 만들어 파는 ‘공공공간’. [사진 각 업체]
전문가들은 소셜벤처의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고 강조한다. 소셜벤처는 기존 기업에 비해 진출할 수 있는 분야가 다양하고, 이를 파고 들어 지속 가능한 사업 모델로 꾸릴 수 있다는 얘기다. 한상엽 소풍 대표는 “비영리 분야는 사회기관, 영리 분야는 소셜벤처가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소셜벤처 컨설팅 기업인 MYSC의 김정태 대표는 “소셜벤처는 미래 비즈니스의 선행지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