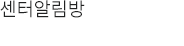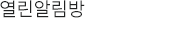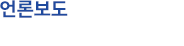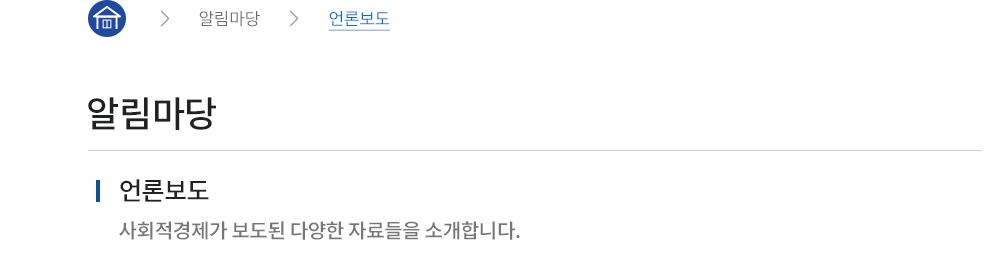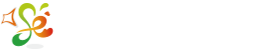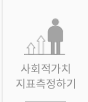우후죽순 사회적 기업… 속사정은 '문 닫을판'
페이지 정보
본문
흑자 낸 곳 10%대 불과 나머지는 정부지원으로 연명
시한 지나면 인력 감축 '취약층에 일자리' 취지 무색 사회서비스 수준도 빈약
"경영 컨설팅 등 차별화로 기업 자생력 길러줘야"
김민호기자 kimon87@hk.co.kr
- 입력시간 : 2014.03.05 21:01:29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이
지난 7년간 그 숫자가 18배 늘었다. 그러나 이런 양적 팽창 이면에는 정부의 지원 없이는 당장 문을 닫아야 할 빈 껍데기 상태의 기업이
수두룩하다는 문제가 숨어 있다.
사회적기업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취약계층 지원 수단의 하나로 등장했다. 풀뿌리처럼 퍼진 민간 기업에게 정부 조직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맡기자는 취지로 시작됐으며, 2007년부터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시행돼 본격적인 틀을 갖추었다. 이때부터 정부는 취약계층을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하거나 간병, 교육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에 대해 지원을 해 왔다.
그
결과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인증사회적기업은 2007년 55개에서 지난해 말 1,012개로 늘었다.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을
합치면 사회적기업은 2,534개에 달한다. 이들 기업 직원 중 60%(1만3,661명)는 장애인, 저소득자 등 취약계층이다. 겉으로는
사회적기업이 단단히 뿌리내린 것처럼 보인다.
......
<저작권자 ⓒ 인터넷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http://news.hankooki.com/lpage/economy/201403/h2014030521012921500.htm
- 이전글끄떡없는 동네슈퍼들 뒤에 ‘협동조합 물류센터’ 있었다 14.03.11
- 다음글돈 되는 착한 투자… 10년 내 1조달러 몰린다 14.03.11